지난 봄, 코로나 19가 대학생들의 삶을 덮쳤다. 개강이 조금씩 미뤄지더니 결국 온라인으로 개강을 했다. 캠퍼스는 모니터 화면 안에 갇혔다. 온라인 수업에서 작은 화면 속의 사람이 내 대학생활을 함께 할 '동기'라는데 얼굴조차 잘 보이지 않는다.
얼마 지나지 않아, 400만원짜리 '인강'을 보다 지친 대학생들이 나서기 시작했다. 십여 년 전 반값 등록금 이후 대학생들이 집단적으로 처음 모인 일이었다.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며 세종시 교육부 청사에서 국회까지 행진을 하기도 했다. 대학들은 돈이 없다고 맞섰지만, 결과적으로는 대부분 타협을 통해 5%에서 10%까지 장학금 명목으로 등록금을 돌려주았다.
2021년, 온라인 개강을 하는 두 번째 해가 되었다. 대학생활을 시작하는 신입생조차 캠퍼스에서 수업을 들을 것이라는 설렘이나 기대는 크게 없었다. 다른 학생들은 이제 시작 5분 전에 일어나도 되는 온라인 강의가 편하기까지 하다. 과제부터 팀플, 시험의 난이도, 교수님의 해설능력 등 다양했던 수업 선택의 기준은 대부분 실시간 강의인지 녹화강의인지로 모아졌다. 학교를 제대로 다닌 것 같지도 않은 20학번에게 후배가 생겼단다. 아직도 캠퍼스는 모니터 화면 안에 갇혀있다.
우리는 대학을 왜 다니는 걸까?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가 가장 흔한 진심일 것이다. 대학 졸업장은 학벌 뿐만 아니라 전문 분야를 나타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시험을 칠 자격이 주어지기도 한다. 녹화 강의는 다소 부족하지만, 이런 역할을 조금씩 채워나가고 있다.
하지만 대학은 단순히 수업만 듣는 공간이 아니다. 대학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토론을 하며 민주적 시민으로 성장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있기 때문이다. 학생회, 학회, 동아리부터 취업스터디와 수업 팀플까지, 우리는 학교를 다니며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토론을 하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내 생각이 바뀌기도, 남의 생각을 바꾸기도 한다. ‘사람을 만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보다 성장하고, 이 사회 속 시민이 될 준비를 한다. 이 부분은 온라인 수업이 발전하더라도 절대 채워질 수 없다.
학생들만 걱정하는 게 아니다. 교수님들도 교실에서 학생 대신 카메라를 보면서 강의하는 것이 불편하고 어색하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학생과 교수 사이에서 원활한 관계 형성이 안 된다는 것은 단순히 수업에 대한 학생의 흥미가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학부 졸업 이후 학문을 깊이 공부하기 위해 대학원을 진학하는 이들도 당연히 줄어든다는 뜻이기도 하다. 개별 교수의 관점에서는 후배 학자가 줄어든다는 것이고, 사회 전체로 시야를 넓히면 대학의 본질 중 하나인 연구 기능이 크게 약화됨을 의미한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외 지역 대학들은 등록금 반환 정도는 무의미할 정도로 다른 차원의 문제를 겪고 있다. 대규모 신입생 미달로 3~4년 안에 대학이 문을 닫아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수도권 밖 대학들은 학과를 통폐합하고, 신입생에게 아이패드, 아이폰을 주면서까지 입학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인구 절벽’ 세대가 장기화되며 일어난 일인 만큼 빠른 시일 내 해소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수도권 외 대학은 ‘지잡대’ 등으로, 그 학생들은 ‘공부 못한 애들’ 정도로 이해된다. 하지만 전체 대학생 중 수도권 밖 대학의 인원이 60%인 상황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외면해도 되는 걸까?
다시 질문해보자. 등록금 반환으로 문제가 해결되었을까? 교수님이 매 해 새로운 녹화강의를 찍고, 대학이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부당한 이익'을 남기지 않으면 되는 문제일까? 코로나 19는 그동안 대학이 겪고 있던 문제를 모두 수면 위로 올려놓았다. 하지만 진짜 해결된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는 왜 대학에 왔는지, 대학이라는 곳이 어떤 공간이어야 하는지 고민해보자. 등록금 반환이 돌려주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지 고민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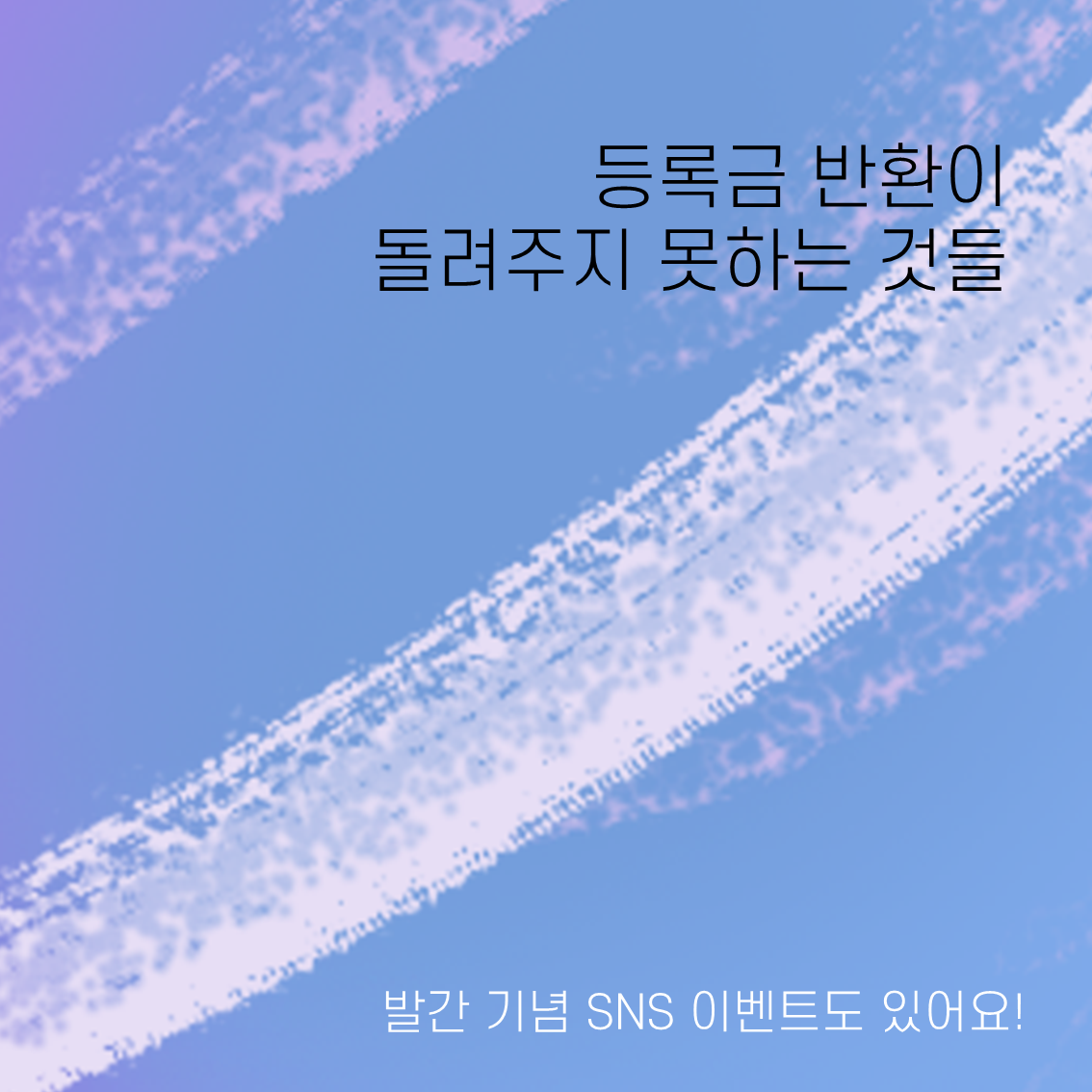
지난 봄, 코로나 19가 대학생들의 삶을 덮쳤다. 개강이 조금씩 미뤄지더니 결국 온라인으로 개강을 했다. 캠퍼스는 모니터 화면 안에 갇혔다. 온라인 수업에서 작은 화면 속의 사람이 내 대학생활을 함께 할 '동기'라는데 얼굴조차 잘 보이지 않는다.
얼마 지나지 않아, 400만원짜리 '인강'을 보다 지친 대학생들이 나서기 시작했다. 십여 년 전 반값 등록금 이후 대학생들이 집단적으로 처음 모인 일이었다.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며 세종시 교육부 청사에서 국회까지 행진을 하기도 했다. 대학들은 돈이 없다고 맞섰지만, 결과적으로는 대부분 타협을 통해 5%에서 10%까지 장학금 명목으로 등록금을 돌려주았다.
2021년, 온라인 개강을 하는 두 번째 해가 되었다. 대학생활을 시작하는 신입생조차 캠퍼스에서 수업을 들을 것이라는 설렘이나 기대는 크게 없었다. 다른 학생들은 이제 시작 5분 전에 일어나도 되는 온라인 강의가 편하기까지 하다. 과제부터 팀플, 시험의 난이도, 교수님의 해설능력 등 다양했던 수업 선택의 기준은 대부분 실시간 강의인지 녹화강의인지로 모아졌다. 학교를 제대로 다닌 것 같지도 않은 20학번에게 후배가 생겼단다. 아직도 캠퍼스는 모니터 화면 안에 갇혀있다.
우리는 대학을 왜 다니는 걸까?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가 가장 흔한 진심일 것이다. 대학 졸업장은 학벌 뿐만 아니라 전문 분야를 나타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시험을 칠 자격이 주어지기도 한다. 녹화 강의는 다소 부족하지만, 이런 역할을 조금씩 채워나가고 있다.
하지만 대학은 단순히 수업만 듣는 공간이 아니다. 대학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토론을 하며 민주적 시민으로 성장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있기 때문이다. 학생회, 학회, 동아리부터 취업스터디와 수업 팀플까지, 우리는 학교를 다니며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토론을 하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내 생각이 바뀌기도, 남의 생각을 바꾸기도 한다. ‘사람을 만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보다 성장하고, 이 사회 속 시민이 될 준비를 한다. 이 부분은 온라인 수업이 발전하더라도 절대 채워질 수 없다.
학생들만 걱정하는 게 아니다. 교수님들도 교실에서 학생 대신 카메라를 보면서 강의하는 것이 불편하고 어색하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학생과 교수 사이에서 원활한 관계 형성이 안 된다는 것은 단순히 수업에 대한 학생의 흥미가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학부 졸업 이후 학문을 깊이 공부하기 위해 대학원을 진학하는 이들도 당연히 줄어든다는 뜻이기도 하다. 개별 교수의 관점에서는 후배 학자가 줄어든다는 것이고, 사회 전체로 시야를 넓히면 대학의 본질 중 하나인 연구 기능이 크게 약화됨을 의미한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외 지역 대학들은 등록금 반환 정도는 무의미할 정도로 다른 차원의 문제를 겪고 있다. 대규모 신입생 미달로 3~4년 안에 대학이 문을 닫아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수도권 밖 대학들은 학과를 통폐합하고, 신입생에게 아이패드, 아이폰을 주면서까지 입학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인구 절벽’ 세대가 장기화되며 일어난 일인 만큼 빠른 시일 내 해소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수도권 외 대학은 ‘지잡대’ 등으로, 그 학생들은 ‘공부 못한 애들’ 정도로 이해된다. 하지만 전체 대학생 중 수도권 밖 대학의 인원이 60%인 상황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외면해도 되는 걸까?
다시 질문해보자. 등록금 반환으로 문제가 해결되었을까? 교수님이 매 해 새로운 녹화강의를 찍고, 대학이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부당한 이익'을 남기지 않으면 되는 문제일까? 코로나 19는 그동안 대학이 겪고 있던 문제를 모두 수면 위로 올려놓았다. 하지만 진짜 해결된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는 왜 대학에 왔는지, 대학이라는 곳이 어떤 공간이어야 하는지 고민해보자. 등록금 반환이 돌려주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지 고민해보자!